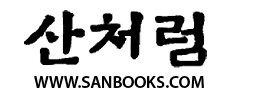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국민일보] 춘향 내리친 곤장은 불법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6 00:00
조회2,58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네 죄를 고하여라/심재우/산처럼
제 아무리 세게 친들 저렇게 얇은 회초리에 살점이 튀긴 어렵다. 그림 1은 ‘태’ 혹은 ‘장’으로 불리는 길이 1m, 지름 1㎝ 안팎의 매질 도구. 흔히 ‘곤장 때린다’고 할 때 곤장은 태나 장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곤장은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처벌할 때만 사용됐기 때문이다. 변사또 같은 고을 수령이 백성인 춘향이를 혼내줄 때 곤장을 휘두르는 건 불법이었다는 얘기다.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진짜 곤장(그림 2)은 몇 대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치명적 형벌기구였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체벌 행위는 전근대적 징표로 여겨진다. 학교와 경찰, 재판이 폭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근대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구한말 한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16일 동안이나 한강변 백사장에 효시됐던 김옥균의 머리를 보며 경악했다. 잔혹한 행위의 주체가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 무렵 사지를 찢는 능지처사나 참형이 조선에 드물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능지처사나 효시가 조선이 야만국이라는 증거일 수는 없다. 기록이 전하는 조선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 법과 제도의 그물망은 어떤 근대국가보다 촘촘했다. 상대적으로 ‘잔인했던’ 곤장의 경우에도 제작 및 사용 매뉴얼이 확실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 얼마나 크게 만들지’ ‘누가 어떤 급의 곤장을 쓸 수 있는지’까지 법이 정했다.
고문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정확했다. 이를테면 죄인을 의자에 앉힌 뒤 ‘신장’이라는 도구로 때릴 때도 “무릎 아래를 때리되 정강이에는 이르지 않도록” 했다. 압슬(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는 것), 낙형(달군 쇠로 지지는 것) 같은 고문법의 경우에는 죄목이 특정됐다. 그나마 압슬 등 대표적 악형은 영조 이후 폐지됐다.
세종 때 기록을 보면, 인권이 근대의 발명품인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세종은 감옥의 표준 설계도인 ‘옥도(獄圖)’를 반포했다. 전국의 감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죄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남녀는 반드시 따로 수감하고, 겨울용 여름용 감옥을 별도로 지어 수감자가 얼어 죽거나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감옥 운영 규칙에 따르면, 계절별로 죄인이 목욕과 머리감기를 허락받을 수 있는 횟수까지 정해졌다.
물론 법전에 적혀 있다고 그대로 시행된 건 아니다. 지방 관아에서는 춘향이가 곤장을 맞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법에서는 사라진 압슬이 행해지거나, 발바닥 이외 부위에는 금지된 낙형을 얼굴에 가하는 일도 있었다. 죄인이 목욕할 권리를 찾기도 쉽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래도 사적 복수가 횡행했던 근대 초입 영국 런던이나 식민지 미국 뉴욕 같은 도시와 비교해, 유독 조선을 야만국이라 부른다면 억울한 일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