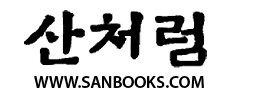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한겨레] 이상엔 둔감, 이익엔 민감한 정치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14.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 대한민국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정쟁(政爭)을 없애려면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주경철 지음 산처럼
“고요를 깨지 말라.” 영국 총리 월폴의 모토였단다. 1700년대, 대영제국은 한참 잘나가고 있었다. 식민지에서는 엄청난 부가 굴러들어오고 있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시끄럽게 들쑤셔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정치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굴러갔다. 그럴수록 온갖 비리와 부정이 판을 쳤다. 좋은 정치는 이상을 좇지만 썩은 정치는 이익만 챙기려 한다. 정치가들은 자잘한 이익을 놓고는 심하게 다투었다. “영국은 더 이상 민족도 아니다”는 말이 떠돌 만큼 나라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는 이 무렵에 나왔다. 책에서 조너선 스위프트는 영국 정치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소인국’에서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 심하게 다툰다. 싸우는 이유는 구두의 굽 높이에 있었다. 한쪽은 높은 굽을, 다른 쪽은 낮은 굽을 고집한다. 현재 국왕은 낮은 굽을 신는 이들을 좋아한다. 문제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는 높은 굽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굽을 신는 이들 쪽으로 권력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였다. 왕자는 불안한 상황을 잠재우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냈다. 한 발은 높은 굽을, 다른 발을 낮은 굽을 신고 다니는 식이었다. 읽다 보면, 자잘한 문제를 갖고 다투던 당시 영국의 모습이 떠오른다.
| ||||||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는 더 우스꽝스럽다. 여기서도 정치 다툼은 박이 터지게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학자들은 정쟁을 풀 해법을 내놓는다. 정당마다 의원 100명씩을 고른다. 그리고 뇌를 반으로 자른 다음, 서로 다른 편 뇌에 붙여 준다. 물론 머리 안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상대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치판에서 마주선 이들을 보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걸리버 여행기>는 <테이레시아스의 역사>에 소개된 다양한 고전 가운데 한 권이다. 지은이 주경철 교수는 고전이 쓰일 당시의 맥락을 짚어준다. 나아가 우리 시대에 주는 가르침도 놓치지 않는다. <걸리버 여행기>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답답한 여의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자잘한 이익을 놓고 다투는 모습은 옛날 영국이나 지금의 우리 국회나 다를 바 없다. 꼬인 현실을 풀어줄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을까?
이럴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혹하게 다가온다. 정치는 현실이다. 어설프게 이상만 내세우다간 나라만 결딴내기 십상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정치가란 약속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 때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신뢰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러니 구태여 올곧게 살겠다며 버둥거릴 필요가 없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가는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군주란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 함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하긴 사람들은 이상만 앞세우는 정치가보다,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를 좋아한다.
마키아벨리가 들려주는 통치기술은 더욱 입을 벌어지게 한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해를 끼치기를 덜 주저한다.” 한마디로 사랑보다는 협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뿐 아니다. 상대를 밟아야 할 때는 철저하게 짓이겨 놓아야 한다. 아예 덤벼들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말이다.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도 못 낸다.”
물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익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찔끔찔끔 내놓으라고 충고한다. 상대가 더 많은 몫을 얻고 싶어 애가 타도록 말이다. 이권에 절절해질수록 상대방은 내 말을 더 잘 들을 테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듣고 있자면 기가 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차라리 70~80년대의 독재 시절을 좋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쓸데없는 말다툼은 이제 질렸다. 차라리 엄청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든다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읽어볼 일이다. 유토피아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 사회를 말한다.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은 유토피아를 ‘사회에 변화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이념틀’이라고 보았단다. 주경철 교수는 유토피아를 ‘천년왕국설’(millenarianism)과 견주어 설명한다.
천년왕국설은 옛날 유럽의 민중들이 꿈꾸던 세상이었다.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시대가 열린다는 소망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그냥 불만스러운 현실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바람만 가득하다. 반면, 유토피아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내놓는다. 토머스 모어도 <유토피아>에서, 정부와 경제를 어떻게 꾸릴지를 넘어, 가족과 식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읽다 보면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힌다.
새해 예산안 처리,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누군가는 마키아벨리가 내세우는 강한 지도자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유토피아의 꿈이 분명하면 다툼도 쉽게 끝난다.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무엇이 꿈을 이루는 데 더 나은지만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점점 17세기의 영국 의회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권에는 민감하지만 이상에는 둔감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요즘이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기사 원문 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54698.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