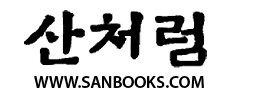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한국일보] 히틀러를 이 시대에 데려다 놓는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납작했더라면?” 수없이 들었을 낡디 낡은 가정 중 하나다.
“만약 나폴레옹의 키가 조금만 컸더라면?”도 식상하기로는 이에 못지 않다. 진부한 표현에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얼마나 높았는데?”라고 정색을 하고 묻는다거나 “나폴레옹은 실제로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었대!”라고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나’를 말하기 위해 빌린 표현임을 대개가 알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 마거릿 맥밀런 옥스퍼드대 교수의 책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도 인물에 초점을 뒀다. “역사가 잔치라면 맛은 그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보는 저자는 개인의 특성이 어떤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어떤 사건을 야기하며, 그 사건은 어떻게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로 역사를 서술한다. 마거릿은 ▦리더십 ▦오만과 독선 ▦모험심 ▦호기심 ▦관찰과 기록 등 다섯 가지 인간형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분류해 그들이 대체 어땠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들이 나왔는지 짚어본다.

책에서 히틀러는 “사교장 같은 데서 나서기를 좋아했”던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천재적인 독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탈린은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자주 무식정이처럼 욕"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수출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곡물을 앗아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책에서 아돌프 히틀러(1889~1945)와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간으로 한 데 묶였다. 철저히 목적지향적이었던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일 민족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끝내 비극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도 혹은 파멸을 애써 모른 체 하며 내달렸고 수많은 죽음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에서, 전쟁 중 구체제가 무너진 러시아에서 권좌에 오른 히틀러와 스탈린은 “자신들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내적 확신”만 키워갔고 “인간의 영혼을 개조할 수 있다”는 섬뜩한 믿음마저 가졌다.
히틀러와 스탈린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혹자는 역사라는 도도한 흐름을 고작 일개 인간의 특성에서 풀어가는 책의 방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듯 역사란 “수렵에서 농경으로의 변화”나 “인구 증가나 이주, 경제 생산” 같은 장기적인 변화들, “정치와 지적 유행, 또는 이데올로기” 등 단기적인 요인들도 함께 따져 살펴야 한다. 두 리더의 ‘내적 확신’도 사실 따져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떠받들듯이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떠받들었”던 추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여인들은 히틀러가 밟고 지나간 자리의 자갈을 주워먹을 정도로 그를 사모했고, 스탈린이 죽었을 때 어떤 국민들은 ‘슬퍼서’ 울었다.
그럼에도 책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제목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질문에 있다.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책임’이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 위기나 침체된 사회 분위기 등 끌어다 쓰기 좋은 애매한 말들로 대신하고, 관행이나 관례로 뭉개는 것은 결국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시대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이 책은 세월호 참사부터 옥시 사태까지 치유해야 할 상처가 도처에 널렸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실에 대한 채찍질이다. 우리의 지금은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선적이고 오만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무의미한 가정보다 덜 슬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신은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