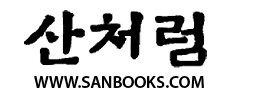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한겨레] 기원을 향한 열망 또는 욕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갈망에 대하여
수잔 스튜어트 지음, 박경선 옮김
산처럼·2만2000원
<갈망에 대하여>. 제목만 보고 잔잔한 에세이라고 생각해 책장을 펼쳤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민속학, 기호학, 정신분석학 등에 정통한 수잔 스튜어트가 풀어놓는 갈망의 근원과 그로부터 연유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상징물들은 만만찮다. 그가 시인이자 비평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저자가 강조하는 노스탤지어라는 사회적 질병과 병에 부수하는 갈망이라는 통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스스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스튜어트식의 갈망 분류는 참고할만 하다. 여기서 갈망은 간절한 욕망, 임신 중 여성이 느끼는 공상 섞인 열망,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때로는 욕망하는) 소유물 또는 부속물 등으로 나뉜다. 옳고 그름이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공감이다.
몸풀기가 끝났다면 저자가 던져놓은 미니어처, 기념품, 수집품 등이 의미하는 상징체계의 문턱을 넘는 게 어렵지만은 않다. 개인의 공간과 시간의 은유로서의 미니어처(예를 들면 인형의 집), 이 미니어처와 거대한 것(자연)에서 개인과 사회가 부대끼며 형성되는 담론의 원형질을 읽어내는 모양새가 낯설지만 흥미롭다. 같은 방식으로 읽어가면 기념품은 모든 기원(원래의 것)을 향한 갈망이며, 수집품은 역사의 공간이자 소유물로 변형되는 장소가 된다는 대목에 이를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냉장고에 붙어 있는 런던 브리지 병따개나 어린시절 모아뒀다가 깜빡 잊은 귀한 우표첩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 내 갈망(욕망)이 투영돼 있다는 사실에 혼자 웃음지을 지도 모르겠다.
글쓰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지금, 손글씨와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글쓰기의 정중함을 연결짓는 대목 또한 도드라진다. 손글씨는 몸의 속도를 미리 상정해 두는 것이므로 개인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기시감마저 든다. 소설가 김훈의 “연필로 글을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닮았다. 물론 김훈과 스튜어트의 간극은 위악과 현학이라는 점에서 시인과 기자(출신의 소설가)의 차이보다 더 넓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