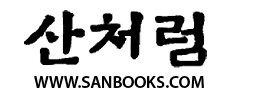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경향신문][책과 삶]학살도 사찰도 사상의 지배를 겨냥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ㆍ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
ㆍ한성훈 지음 | 산처럼 | 488쪽 | 2만5000원

제주4·3 연구소 현장 조사반이 1992년 4월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굴에서 4·3 희생자 유골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70년 전 발생한 제주4·3은 한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2000년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민간인 희생자 수는 1만4028명.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에 따르면 전체 희생자 수는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학살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을까.
이 책은 사회학자인 저자가 1999년부터 관심을 가져온 전쟁과 학살, 사상의 지배, 사찰, 감시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 성과다. 전쟁과 학살이 발생하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국제전이든, 내전이든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대량학살은 전쟁의 목표이자 전투 수행의 본질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량학살은 1945년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다. 제주4·3과 여순사건, 국군 11사단의 빨치산 토벌작전, 노근리 사건 등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부역혐의자 등도 학살의 대상이었다.
![[책과 삶]학살도 사찰도 사상의 지배를 겨냥한다](http://sanbooks.web01.ybuilder.kr/data/editor/2111/l_2018031701001865200162371.jpg)
저자는 책 초반부에서 인간이 학살을 수행하게 되는 동기를 추적한다. 그는 “학살을 수행하는 가해자의 이데올로기는 살해를 거부하는 도덕적 요구와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성의 도구적 합리성 형태를 띤다”고 말한다. 제주4·3에서 발현된 광기는 반공과 애국심에 근거했다. 이 근거에 일체화된 이들은 인권침해를 쉽게 일삼을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은 제주4·3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우익단체 서북청년회의 정치적 입장을 이용했다.
국제정치 안에서나, 주권국가 안에서나 정치권력은 학살을 외면하고 때론 정당화한다. 저자는 “(제주4·3 등)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상황은 체제를 수립하는 이행기와 전시였고 그 동기는 국민국가 건설과 안보라고 내세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대량학살은 제대로 소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로의 이행 이전까지 한국 사회가 민간인 학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연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사실에 함부로 맞설 수 없었”고, “사상의 이름 ‘빨갱이’라는 수사로 희생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학살이 발생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의 삶과 정치를 살핀다. 학살은 사상의 지배와 정치적 의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학살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피학살자의 가족들을 옭아맨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신원조사와 연좌제, 권력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책에서는 가족의 죽음에 드러내 슬퍼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받았던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도 소개한다.
저자는 “공동체가 피학살자와 그 친족의 존재를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2005년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일부 과거사 청산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책에선 정부의 각 기관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실효성은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복기한다. 또한 저자는 과거 정치권력이 학살로 반대자를 제거했다면 근래엔 사찰, 감시, 사상의 지배와 같은 좀 더 연성적인 권력 작용으로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이후 확대된 시민 감시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려 한 시도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민주정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을 올바르게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치철학 이론부터 개별 학살사건의 역사, 피해자 가족들의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책이다. 이 때문에 단번에 읽기엔 어렵다. 대신 천천히 읽고 과거의 잘못을 성찰해볼 계기를 제공한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묻는다. 전쟁과 학살, 사상의 지배 모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사상을 문제 삼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상 때문에 공동체에서 ‘낯선 타자’로 설정되면 그는 ‘죽음의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문제는 죽음도 삶도 인간의 존엄성에 있을 것이다. 일말의 존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죽음이라면 인간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죽어가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비롯했다.”
김향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