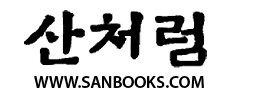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매일신문]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안대회 엮음/산처럼 펴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다행히도 재주 없어 책 표지
다행히도 재주 없어 책 표지
고려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시인들이 쓴 빼어난 한시 152편을 뽑아 번역하고, 한편 한편 그 작품의 배경을 해설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나 한시 선집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작품은 드물고, 대부분 생소한 작품들이다.
◇ 인생 희로애락 담긴 작품 주로 선정
지은이는 "흔히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 널리 읽히거나 정평을 누리는 선집에 수록되어 독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명작으로 꼽혀 온 작품을 가리킨다. 이는 역사적 비중과 작가의 역량을 두루 평가해 형성된 목록인 만큼 무시 못 할 권위를 지닌다. 그런 목록은 필요하고 독자들의 독서에 도움을 준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책에서는 일부러 그 목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옛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 목록이 오히려 굴레일 수 있어 필자만의 안목과 기준으로 작품을 뽑고 이해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지은이가 밝힌 작품 선정 기준은 '시인들이 각자 한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희로애락을 녹여낸 작품들로 독자가 공감할 만한 풍경과 감성이 배여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까닭에 이 책에는 문학사에 이름을 올린 저명한 시인은 물론, 문단 말석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무명 시인들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 기승전결 구조 바탕으로 작품 배치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한시작품의 기본적인 형식이 '기승전결'이고, 우리 인생 또한 기승전결의 서사구조를 띤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는 출발 혹은 시작을 알리거나, 갈등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주로 배치 돼 있다.
'마흔 살은 다부지게 일할 나이/ 오늘로 두 살이나 더 먹게 됐네/ 도소주는 나중에 마셔도 좋으련만/ 늙고 병들기는 남보다 빠르구나/ 세상살이는 어떻게 힘차게 하나?/ 가난한 살림살이를 피할 길 없네/ 은근하게 한 해의 일 다가오려나/ 매화에도 버들에도 생기가 돋네.'
조선전기 학자 서거정(1420~1488)이 마흔 두 살이 되는 1461년 새해 첫날 지은 시다. 제목은 '원일(元日; 새해 첫날)'이다. 도소주는(屠蘇酒)는 정초에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나눠 마시는 찬술로 '세시주(歲時酒)'라고도 한다.
서거정은 이 작품에서 나이듦과 벗어나기 힘든 가난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은근한 기대와 생동감을 매화와 버들을 통해 보여준다.
◇ 고통 속에 스러져간 시인의 하루
'밝은 해가 굴러굴러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때마다 나는 항상 통곡하고 싶어지더라/ 남들은 그러려니 일상으로 여기고서/ 저녁밥 어서 내오라 그냥 다만 재촉한다.'
조선 영조 말엽의 시인이자 역관이었던 이언진(1740~1766)의 작품 '골목길'이다. 생몰연대에서 보듯 그는 요절했다. 병이 깊었던 그는 하루해가 지는 광경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신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느꼈다. 그러니 그에게 하루해가 떨어지는 광경은 남들처럼 '그렇고 그런 일상'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먹을 때 배설을 걱정해야 할 만큼 몸이 많이 아팠다. 배설조차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또 다시 다가온 한끼의 식사는 생명수인 동시에 고통이자 비애일 수밖에 없었다.
'남들은 그러려니 일상으로 여기고서/ 저녁밥 어서 내오라 그냥 다만 재촉한다' 고 노래하고 이언진은 붓을 내려놓았다. 죽을 만큼 아픈 자신의 상황을 세세히 말하지 않고도, 더 큰 울림을 드러내는 솜씨는 그의 시적 재능을 짐작케 한다. 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언진에 대한 해설은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에 더해,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을 덧붙였음을 밝혀둡니다.)
◇ 한번쯤 읽어보기를 강권하고 싶어
'황량한 들녘에는 쭉정이뿐/ 과부가 나와 줍고/ 벌레 먹은 복숭아나무 아래/ 동네 아이들 싸우고 있다/ 돌보는 농부 없이/ 병든 이삭 가득한 논에서는/ 송아지 딸린 황소만이/ 마음대로 먹어 치운다/ 타작할 볏단 한 묶음/ 마당에 들어오지 않고/ 해질 무렵 참새 떼만/ 황량한 마을에 시끄럽다/ 밑도 끝도 없는 시름 풀풀 나서/ 책 던지고 누웠더니/ 때맞춰 숲 바람 불어와/ 문을 쾅 닫아 버린다'
조선 정조와 순조 대의 학자 이충익(1744~1816)이 갑술년(1814) 가을을 소재로 쓴 시다. 그 해에는 유례없는 가뭄에 대홍수까지 겹쳐 들판의 곡식은 병들거나 쭉정이가 전부였다. 영남지방이 가장 심했다. 이충익이 머물던 경기도는 그나마 나았지만 들판이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한시 작품들은 주로 임금에 대한 충절, 기생과 사랑, 정인과 이별, 계절의 아름다움, 글 읽기의 즐거움, 시국에 대한 우려 등이 주제였다. 어떤 면에서 꽤 고상한 작품들이었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작품들과는 색감과 결이 많이 다르다. 삶의 풍경이 가득한 작품들이다. 일독을 강권하고 싶다.
327쪽, 1만 6천원.
조두진 기자 earful@imae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