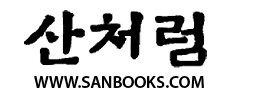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한겨레] 과학기술로 쌓은 서양 이데올로기의 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유럽인들 몸속엔 축구와 예술, 그리고 자부심이란 세 종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인류가 향유하는 정신과 문명의 큰 뿌리가 그들의 땅과 조상에 박혀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자부심의 바탕일 것이다. 자부심이란 말 정도로 다른 세상과 타협하기 전까지 유럽인들이 가른 세상은 단순했다. 사람(유럽인)과 미개인 또는 야만인이 사는 세상. 그 기준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마이클 에이더스 미국 럿거스대 교수가 쓴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는 과학과 기술이란 잣대로 탄생했고, 그것으로 입지를 다져온 서양 우위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파헤친 책이다.
유럽인의 눈에 비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 영국 지리학자 존 배로는 1793년 사절단 일원으로 중국 청나라를 다녀온 뒤 쓴 <중국 여행>에서 중국을 “한마디로 수준 떨어지고 막돼먹은 나라”로 묘사했다. “공기펌프와 여러 종류의 전기장치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환관은 황제에게 황손을 위한 장난감이라고 보고했다.” 오래전 제지술, 나침반, 화약을 발명했던 나라라는 존경심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비웃음거리를 찾아 그들의 미개함을 드러내기 바빴다. “그들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주는 선물을, 오랑캐들이 탄원을 하기 위해 바치는 공물로 간주했고…(영국이 몇몇 안건에 반대하자) 설사용 약제로 쓰이는 대황근의 수출을 막아서 나라밖 이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비의 고통을 안겨 주겠다고 위협했다.”
유럽인들은 과학과 기술을 한 사회의 수준은 물론 인간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겼고, 그것으로 세상의 등급까지 매겼다. 그 바탕에서 형성된 서양 우위 관념은, 19세기 유럽인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던 ‘문명화 사명(使命) 이데올로기’로 이어졌다. “원주민들이 인종적으로 자신들의 사회를 통치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은 충분히 성숙한 인종인 유럽인의 임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관념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서양문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만든 과잉생산으로 질식할 지경이었고, 그 돌파구로 전쟁은 필연이었다. 전쟁은 정교하게 사거리를 계산한 포탄 하나에 수십 명의 몸이 찢기고, 최고의 화학자들이 달라붙어 만든 생화학탄 하나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었다. 지은이의 말대로 참호 속의 죽음은 멀리 떨어진 기계에서 우연히 날아오는 비인격적인 포탄으로 찾아왔고,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옷을 입은 전문화한 인간 도살산업”이었다.
그제야 반성이 시작됐다. 프랑스 르네 게농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가치나 문명화된 성취를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게 서양인들의 ‘발전 강박증’은 그들의 내적 천박함과 사상적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유럽인의 ‘문명화 사명 이데올로기’도 정복과 경제적 야망을 은폐하기 위한 가면 장치에 불과했다. 유럽인의 오만은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겼다.
지은이는 동양정신의 회복을 주문한다. 모든 생명의 궁극의 진리에 가장 근접했던 고대 인도인들의 가르침 등 동양의 지혜에 이제라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동양의 ‘평정’도 ‘정체’로 읽힌다. 우리가 그랬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서양은 ‘물질적 야만주의’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쪽에 서 있는 우린 여전히 발전 타령이고, 서양이 반성하는 그 길을 못 가서 안달이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61204.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