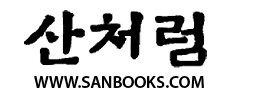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동아일보]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는 허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6 00:00
조회2,37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는 목에 칼을 쓴 채 옥살이를 하고, 흥부는 쌀값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부자를 대신해 곤장 30대를 맞고자 한다. 옛 소설이나 사극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조선시대에서도 벌어졌을까?
칼은 실제론 여성에게 사용이 금지된 형구였고, 곤장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과 달리 10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터지고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위력이 대단해 군법을 집행할 때만 사용했다. 일개 고을 사또는 사용할 권한조차 없었다. ‘주리 틀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도 등장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난 형벌이다. 곤장 치기와 주리 틀기의 경우 형구의 크기 및 횟수, 타격 부위까지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죄를 고할 때까지 저놈을 매우 쳐라” 같은 상황은 실제 법 집행상 일어날 수 없었다.
저자는 “중국 명나라 대명률을 따르던 조선의 법률체계는 합리성과 일관성을 지녔지만 능지처사와 같은 몇몇 잔인한 육형(肉刑)과 서구 제국주의의 편협한 인식이 맞물려 평가 절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극 등에서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 재판과 가혹한 형벌 집행 등이 자주 다뤄지면서 조선시대 법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책은 오형(五刑·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으로 구분되는 조선시대 형벌 및 각종 고문법, 소송과 재판, 죄 짓고 벌 받는 사람들의 각종 사연, 법률을 통해 살펴본 조선 사회상 등을 총망라한다. 소설이나 사극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형벌의 오류들도 바로잡고 있다.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 일부는 사형수 출신이었다. 18세기 만들어진 법전 ‘신보수교집록’의 형전 ‘추단’ 항목에는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형수 중에서 망나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숙종의 수교가 실려 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직접 앗아야 하는 아이러니란.
유배(유형·流刑)는 쓸쓸하게만 생각되지만 죄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는 완전히 달랐다. 1722년 유배길에 오른 윤양래는 가는 곳마다 고을 수령에게서 후한 접대와 많은 노자를 받아 물건을 싣고 가던 말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졌다고 한다. 반면 정계 복귀 가능성이 없거나 가난한 이의 유배 생활은 참혹했다. 1613년 제주도에 유배된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는 막걸리를 팔며 생계를 연명해야 했다.

영조는 모진 형벌의 상당수를 없앴다. 특히 영조가 뜨겁게 달군 쇠로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인 낙형(烙刑)을 없앤 이유가 재미있다. 1733년 영조는 몸에 난 종기 탓에 여러 번 뜸을 떴는데, 이때의 괴로움이 낙형의 고통과 오버랩됐다는 것. 이후 죄인을 국문할 때 낙형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잔인한 내용도 적잖지만 옛사람들의 피와 살이 튀는 생생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170여 컷의 컬러 도판과 구한말 형벌 집행 과정 등을 담은 사진도 날것 그대로의 이해를 돕는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