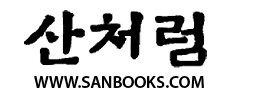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광주일보] 사상을 가둘 감옥은 없다-금서, 시대를 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0 00:00
조회2,1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호기심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비롯된다. 말리는 것일수록 더 해보고 싶은 법이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란 제목의 소설도 그래서 나왔을까.
금서(禁書)는 출판이나 독서를 법으로 금지한 책이다. 정통성에 자신 없는 지배자가, 권력에 반하는 생각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무리수다. 믿음 없는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므로, 금서는 사회 성숙도와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금서의 역사는 깊다. 서양의 ‘일리어드’나 ‘오딧세이’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됐다. ‘보바리 부인’은 불륜을 저지른 후 더 아름다워졌다는 표현 때문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자살을 옹호하고 미화했다는 이유로 금서라는 멍에를 썼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교리에 어긋난다며 사형까지 당했다.
진시황은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해 ‘분서갱유’했고, 노자의 ‘도덕경’도 당대 지배이념에 비추어볼 때는 이단이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은 정조임금으로부터 문체를 바르게 쓰라는 어명을 받았다. 맑스 베버는 우파임에도 ‘맑스’라는 이름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횡행했던 작가에 대한 검열이나 박해는 옛날의 사문난적(斯文亂賊)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금서라는 단어에서는 피 냄새가 난다.
이 책은 금서를 문화투쟁의 관점에서 살폈다. 힘센 자의 밀어붙이기,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갈등과 투쟁을 금서를 통해 읽어냈다. 모두 8종의 금서를 제시했는데, 강연 내용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이야기체 서술로, 편하게 잘 읽힌다.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정감록’의 경우, 체제 전복이나 폭력투쟁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의 소망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정은 무서웠을 것이다. 지배자의 두려움은 금서를 낳는다. ‘태백산맥’은 빨치산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백석 시집’은 시인이 월북해서, ‘오적’은 부패한 정치세력을 비판했기 때문에, ‘조선책략’ ‘금수회의록’ ‘을지문덕’ ‘8억인과의 대화’도 권력자의 눈 밖으로 내쳐졌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사상을 가둘 수는 없다. 책은 불태워 막을지라도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 책의 사활을 결정짓는 것은 지배자의 뜻이 아니라 책 자체의 품격인 것이다. 인간의 DNA 안에 자유를 갈망하는 창작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한, 금서가 설 자리는 없다. 금서로 지정되기만 하면 훗날 필독서나 베스트셀러 같은 명저가 되는 걸 보면, 금서를 쓴 작가는 당대의 불온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독재 권력에 야합했다 해서, 친일경력 때문에, 향락과 퇴폐를 조장했다고 해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서로 묶을 수는 없다. 정조대를 채운다고,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으랴. 사상을 가둘 감옥은 없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금서(禁書)는 출판이나 독서를 법으로 금지한 책이다. 정통성에 자신 없는 지배자가, 권력에 반하는 생각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무리수다. 믿음 없는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므로, 금서는 사회 성숙도와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금서의 역사는 깊다. 서양의 ‘일리어드’나 ‘오딧세이’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됐다. ‘보바리 부인’은 불륜을 저지른 후 더 아름다워졌다는 표현 때문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자살을 옹호하고 미화했다는 이유로 금서라는 멍에를 썼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교리에 어긋난다며 사형까지 당했다.
진시황은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해 ‘분서갱유’했고, 노자의 ‘도덕경’도 당대 지배이념에 비추어볼 때는 이단이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은 정조임금으로부터 문체를 바르게 쓰라는 어명을 받았다. 맑스 베버는 우파임에도 ‘맑스’라는 이름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횡행했던 작가에 대한 검열이나 박해는 옛날의 사문난적(斯文亂賊)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금서라는 단어에서는 피 냄새가 난다.
이 책은 금서를 문화투쟁의 관점에서 살폈다. 힘센 자의 밀어붙이기,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갈등과 투쟁을 금서를 통해 읽어냈다. 모두 8종의 금서를 제시했는데, 강연 내용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이야기체 서술로, 편하게 잘 읽힌다.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정감록’의 경우, 체제 전복이나 폭력투쟁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의 소망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정은 무서웠을 것이다. 지배자의 두려움은 금서를 낳는다. ‘태백산맥’은 빨치산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백석 시집’은 시인이 월북해서, ‘오적’은 부패한 정치세력을 비판했기 때문에, ‘조선책략’ ‘금수회의록’ ‘을지문덕’ ‘8억인과의 대화’도 권력자의 눈 밖으로 내쳐졌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사상을 가둘 수는 없다. 책은 불태워 막을지라도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 책의 사활을 결정짓는 것은 지배자의 뜻이 아니라 책 자체의 품격인 것이다. 인간의 DNA 안에 자유를 갈망하는 창작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한, 금서가 설 자리는 없다. 금서로 지정되기만 하면 훗날 필독서나 베스트셀러 같은 명저가 되는 걸 보면, 금서를 쓴 작가는 당대의 불온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독재 권력에 야합했다 해서, 친일경력 때문에, 향락과 퇴폐를 조장했다고 해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서로 묶을 수는 없다. 정조대를 채운다고,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으랴. 사상을 가둘 감옥은 없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