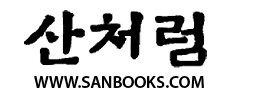[연합뉴스] ´한국인에게 ´조상과 족보´는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8 00:00
조회1,2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인들은 여전히 성씨와 본관에 관심이 많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성씨를 만나면 "본관이 어디요?"라고 묻는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귀화한 외국인도 그렇다.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독일 이씨´,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는 ´영도 하씨´의 시조다.
박홍갑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신간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산처럼)에서 ´조상과 족보´에 관한 한국인의 태도가 일정한 역사성의 틀을 넘어 고유 심성으로까지 파고들어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조상과 족보의 탄생부터 변천 과정, 허구와 실체를 추적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통을 가꿀 방안을 모색한다.
고대국가 이래 한국의 사회적 기본 단위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족(族)이었다. 그러다 통일신라 말기부터 중국식 성을 받아들이고 고려시대에는 본관을 정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배타성을 띠게 됐다. 이후 유교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15세기에 이르면 토착적 수평문화가 유교적 수직문화로 넘어간다.
이런 와중에 조선 사회에 등장한 것이 문중이다. 문중은 토착적 전통과 유교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산물이었다. 문중의 소속 범위는 유교의 사당의례에 참여하는 집단보다 훨씬 넓었고, 형제의 평등 관계라는 토착적 특징을 내포했다. 바로 이 문중에서 시조와 족보가 탄생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17세기만 해도 극소수 양반만이 갖고 있던 족보는 18세기에 접어들면 ´족보 장사´가 생겨날 만큼 많아졌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평민의 경제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문중이 종족집단을 결속하면서 자연히 종손의 위상이 높아졌고 ´정통성´을 둘러싼 소송도 난무했다.
족보와 혈통은 전통사회 지식인의 필수 정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보학(譜學) 커뮤니케이션으로, 선비사회에서는 자신의 족보뿐 아니라 남의 집 혈통까지 꿰고 있어야 대화에 낄 수 있었다. 물론 남성들의 이야기다.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한 17세기 이후 여성은 부계 중심인 족보에서 고작 성과 본관만 거론됐을 뿐이다.
한국의 족보문화는 조상 만능주의와 부계 중심주의에 따른 배타성과 편협성을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명문가´로 일컬어지는 가문 구성원들은 역사 속의 어려운 순간에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저자는 "온고지신과 법고창신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조상과 족보에 대한 전통 만들기와 가꾸기를 다시금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품격 있는 ´양반의 자손´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사회는 갈수록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408쪽. 2만5천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